 |
| 영화 '용의자' |
- 북한 남자는 여전히 우리 환상 속에 갇혀 있다?
최근 북한출신 특수요원들이 상업영화에 빈번하게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특히 액션오락 영화에서 북한 남성들은 남파 첩보원 캐릭터로 애용된다. 영화 <의형제>(2010)는 북한특수요원 지원(강동원)이 북에 있는 아내와 딸의 안전을 위해 어떤 공작이라도 감내하려는 모습을 그린다. 영화 <용의자>(The Suspect. 2013)에서 북한 특수요원 지동철(공유)은 오직 아내와 딸을 죽인 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남한에 머문다. 영화 <베를린>(The Berlin File, 2013)에서는 독일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북한 첩보원 표종성(하정우)이 통역관 아내 련정희(전지현)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데 특히, 뱃속에 아이와 아내를 지키려는 그의 분투가 눈물겹다.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Secretly Greatly, 2013)에서 북한의 남파 특수공작 5446부대요원 원류환(김수현)은 남한에서 위장 간첩으로 활동하며,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다.
이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북한 출신 특수요원들은 모두 엘리트임이 강조되고, 또한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그것이 특수요원의 능력이나 의과적인 능력이든 불문한다. 그들의 외모는 모두 꽃미남이다. <은밀하게 위대하게>에서는 무려 세 명의 꽃미남이 떼로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무엇보다 그들은 주로 사랑하는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생명이 아까운 줄도 모른다. 강한 생명력과 끈질긴 정신, 생의 의지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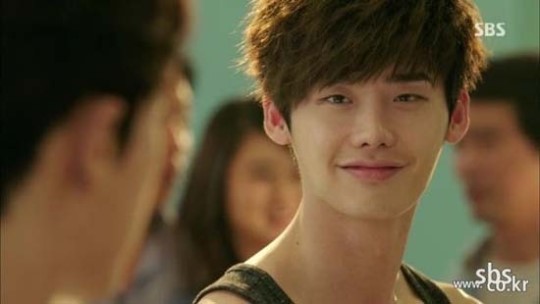 |
| SBS 드라마 '닥터 이방인' |
바로 이전에는 탈북자를 중심에 두는 영화들이 곧잘 제작되었다. <크로싱>(Crossing, 2008)에서는 탈북과정과 정착 생활을 통해 탈북자들의 삶과 가족애를 중심에 두었다. 또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영화 <태풍>(Typhoon, 2005)에도 등장한다. 탈북자 출신의 '씬'(장동건)은 남한에 배신을 당해 가족들을 잃고 절치부심 복수를 다짐했으며 마침내 실행에 옮긴다. 영화 <국경의 남쪽>(South Of The Border, 2006)은 탈북 남녀 간의 사랑이야기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영화에서 북한 출신 남성들은 공통적으로 첩보요원이거나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 더구나 갈수록 <처음 만난 사람들>(Hello, Stranger, 2009)처럼 탈북자들의 국내 정착과정의 현실을 좀 더 밀착하여 다룬 영화는 흔하지 않게 되었다.
그럼 텔레비전 드라마는 어떨까. SBS 월화드라마 <닥터 이방인>은 영화계의 북한 첩보원 코드에서 물러서 있다. 주인공 박훈(이종석)은 평양의대 출신의 외과의다. 북한의 특별관리소에 있다는 송재희(진세연)을 빼내는데, 5만 달러가 있다는 말에 명우대학병원에서 어려운 수술을 자임한다. 그가 다른 북한 남성들처럼 여성에 대한 극진한 사랑이 가득한 남성이기는 마찬가지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가 빼든 것은 총이 아니라 칼 그것도 사람을 살리는 수술 칼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또한 박훈은 능력이 있는 것만 아니라 성격도 좋고 바람직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지닌 존재로 등장한다.
그런데 보통 영화와 드라마를 아울러 북한 남성들은 북에 두고 온 여성을 극진히 사랑한다. 거꾸로 북한 남성들이 남한에 와서 연애 사랑 그리고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은 거의 없다. 조인성-김사랑 주연의 영화 <남남북녀>(南男北女, 2003)에서 남쪽 남성이 북쪽 여성에게 연애를 거는 모습이 나올 뿐이다. 이렇게 북에 두고 온 배우자를 사랑하는 모습은 성실하고 일관된 소망스런 연인의 모습을 북한 남성에게 투영한 것일 뿐이다. 남한의 남성들은 반대로 변덕스러운 사랑의 존재로 대비된다. 다소 거칠기는 하지만 초지일관 자신의 사랑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을 간직한 북한 남성들이다. 그런 점이 결핍된 한국의 현실을 거꾸로 드러내주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왜 결핍되었는지는 담아내지 않는다.
또한 북한 남성들은 대중문화에서 엘리트나 천재로 등장하지만 오만하거나 냉정하지 않다. 순수하고 열정적이며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나아가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마침내 자신의 온몸을 희생한다. 물론 이는 소비주체가 여성이기 때문일지 모른다. 다만 남성들은 첩보활극의 주인공에 감정이입을 하게 될 것이고, 감성적인 희생의 남성적 매력은 여성에게 소구할 것이다. 이런 맥락이라면 대중문화는 북한 남성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남한에서 결핍된 이성의 모습을 투영하는 매개물로 존립한다.
 |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닥터 이방인>처럼 북한 남성이 등장하는 예도 쉽지 않다. 대개 북한 남성의 등장은 북한을 부정적으로 인터뷰하는 시사프로그램에 많다. 특히 종편이후에 이러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종편에서 진정 선호하는 것은 탈북여성들이다.
KBS <미녀들의 수다>를 모방한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아예 탈북미녀 토크쇼를 자임했다. 탈북 여성 가운데에서도 미녀들을 앞에 내세운 셈이다.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의 소비주체는 남성들이다. 그것도 북한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남성들이 시청자 층을 형성한다. 이는 종편의 성격상 시청자의 연령대는 높아지므로 젊은 층보다는 장-노년층 남성 시청자들을 겨냥한 프로그램이다. 정작 탈북남성들이 중심인 교양예능프로그램은 없는 셈이다.
남성캐릭터의 주요 소비자들은 여성이라고 할 때 이는 문화적 선망 심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영화와 드라마에서 북한 남성들은 순수하고 듬직하며 의리를 지키는 헌신적인 존재로 묘사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렇다면 북한 남성들은 하나의 환상 속에 갇혀있는지 모른다.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무엇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갇혀 있을수록 현실에서 벗어난 남성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겠다. 남한에서 볼 수 없는 아니면 좀 더 바라는 소망이 투영되고 있을 뿐 실제 북한의 남성과는 전혀 관계없는 캐릭터들이 횡행하고 있는 셈이다. 그것도 유명한 꽃미남 배우만을 통해서 말이다. 그렇다면 여성을 탈북 미녀로 상품화하는 것과 그렇게 거리가 먼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드라마 <닥터 이방인>에는 북한 출신의 남성이 남한에서 잘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게 한다. 그러나 박훈의 직업은 의사다. 의사 정도가 되어도 차별을 받고 어려움이 있다면, 보통 북한 출신 남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김헌식 문화콘텐츠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