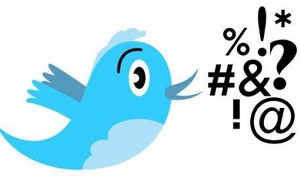 젊은 새대에서 '허언증 놀이'에 집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화면 캡처.허언이란 헛소리다. 거짓말이며 사기이다. 속되게 말하면 구라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세칭 허언증 놀이가 젊은 세대에게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자주 있었다. 병증으로 볼 때는 허언증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을 그대로 믿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면에서 리플리 증후군(Ripley Syndrome)이나 뮌하우젠증후군을 언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젊은 새대에서 '허언증 놀이'에 집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화면 캡처.허언이란 헛소리다. 거짓말이며 사기이다. 속되게 말하면 구라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세칭 허언증 놀이가 젊은 세대에게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자주 있었다. 병증으로 볼 때는 허언증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을 그대로 믿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면에서 리플리 증후군(Ripley Syndrome)이나 뮌하우젠증후군을 언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증상은 상호간에 놀이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반인격장애로 상대방을 속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다. 왜 허언증이라고 했을까 추측을 해보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기존 사고로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허언 놀이를 즐긴다고 하면 단순하니 병을 뜻하는 '증'이라는 말을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허언증 놀이에 참여하는 사람 시각에서는 허세놀이가 적합할 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허언증 혹은 허세 놀이가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요즘의 허언증 놀이는 디지털과 밀접하다. 우선 참여 수단의 관점에서 볼 때, 디지털 기반의 상호작용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댓글 달기 놀이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허언에 댓글이 달리면서 계속 허언이 확장을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상호작용성에 익숙하지 않은 참여자라면 놀이에 참여할 수 없다. 그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펼쳐질 지 짐작할 수 없는 재미도 있다. 물론 이런 형식적인 요인 때문에 참여하는 것만은 아니다.
디지털 공간은 놀이의 유희가 지배하는 공간이라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심각 하거나 심지어 금기시되는 대상도 놀이의 대상으로 삼아 일탈을 간접적으로 즐긴다. 여기에 참여하는 이들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참여한다. 놀이가 늘 그렇듯이 가상 상황이라는 것을 공유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병증하고는 관계가 없다. 병증이 되려면 그것이 진짜라고 믿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놀이 방식은 어린 아이들에게서 발견되고는 한다.
예컨대, 공주놀이 같은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자신이 공주인 것처럼 스토리를 풀어가고 주변 아이들은 그것을 맞춰주면서 놀이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유아적인 현상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이런 놀이가 가능한 것은 어린 아이들은 자신이 스스로 결핍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자신이 되고 싶은 대상에 심리적 투영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예전 전통사회에서 머슴들이 양반놀이를 하는 것과 같은 맥락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양반이나 귀족,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자신이 되고 싶은 대상에 대해서 역할 놀이, 연극 놀이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것은 욕망의 대리투영이라고 할 수가 있다. 현실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이런 허언을 통해서 성취해보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다. 거꾸로 이 시대 사람들이 선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허언의 담론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다. 그것이 디지털 공간으로 이동하여 상호관계성 속에서 재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각종 이모티콘이나 사진, 영상등 다양한 부대 수단은 이러한 놀이를 풍부하게 만든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허언은 능력의 인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거나 특정한 성취를 과시하는 유형이 있는가하면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들은 모두 거짓말이지만, 그것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한다. 더구나 댓글들에 반응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웬만한 능력을 갖지 않고 방어를 하거나 확장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즉 그럴듯하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도 꼼짝 못하게 하는 데서 성취감을 느끼기도 한다.
한편 이런 허언증 놀이가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 어떤 이들은 스토리텔링의 본능 때문이라고 하거나 페이크 현상을 즐기는 취향과 기호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회경제학적으로는 젊은 층들의 미취업, 양극화 등의 현실의 무력감을 이런 허언증 놀이 방식으로 극복하려는 의지의 발현이라고 말한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토대도 계속될 것이다.
다만, 현실에서는 가짜를 진짜로 만들어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들이 많으니 그들보다는 훨씬 건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허언증이라는 병증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히려 놀이로 불합리한 현실을 웃어제끼는 여유가 느껴진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시대에 한 바탕놀이로 조소하고 있는 셈이다.
글/김헌식